[머니위크 커버]뉴시니어 뉴히어로/ 뉴시니어, 뉴시니어를 말하다
1970, 1980년대에 젊은 시절을 보낸 현재의 50~60대는 배고픈 시절도, 오늘날의 풍요로운 시절도 모두 경험한 세대다. 김창남 성공회대 교수도 그렇다. 그는 대학시절 민주화를 위해 부단히도 뛰었다. 김 교수는 민중가요패인 '노래를 찾는 사람들'(노찾사)의 창립멤버로도 활동했다. 현재는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대중문화 이론을 가르치고 있다.
그의 지난 세월은 특히 음악과 연관이 깊다. 한국대중음악 선정위원이기도 한 김 교수는 이론에만 그치지 않고 직접 밴드활동 중이다. 젊은 시절 '노찾사'를 향수하며 2004년 3인조 포크밴드 '더숲트리오'를 결성했다.
그에게 세시봉 열풍은 남다르지 않을 터. 봄이 오고 있는 성공회대 캠퍼스에서 김창남 교수를 만났다. 김 교수에게 최근 부는 뉴시니어 파워의 문화현상을 듣는 한편, 뉴시니어 세대인 김 교수의 얘기도 들어봤다.

◆ 대중문화계의 중년파워
올 초 세계적인 팝스타의 내한이 줄을 이었다. 에릭 크랩튼, 산타나, 이글스 등 뉴시니어의 추억을 자극하는 거장들이 한국을 찾은 것이다. 또 노년의 사랑을 그린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는 중년 관객들을 극장으로 끌어 당겼다. 중장년층의 티켓 파워가 발동한 것이다. 김창남 교수는 이 역시 세시봉 열풍이 계기가 됐지만 근 20년 10대 위주의 문화에 소외된 중년들의 욕구도 있다고 설명했다.
"긍정적인 변화라고 봅니다. 세시봉 열풍으로 그동안 단절됐던 세대간 교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문화적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김 교수는 지금의 열풍 역시 복고의 한 단면이라고 설명한다.
"리메이크나 리바이벌은 문화산업에서는 하나의 전략이예요. 생산자 입장에서 새로운 모험이라는 위험을 떠안는 대신 안전을 기하는 것이죠. 문화계에서 대안이 없을 때는 리메이크나 복고가 유행하게 됩니다. 대박은 못 쳐도 쪽박은 면할 수 있으니까요."
복고의 좋은 점은 중장년층에게 향수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 젊은층에게는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이는 경제와도 맞닿아 있다. 경제가 좋지 않을 때는 젊은층의 구매력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의 구매력은 상승한다는 것이다.
독자들의 PICK!
"70, 80년대의 젊은층은 '소비는 죄'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소비할 줄 모르는 세대였던 거죠. 하지만 이들이 최근 자아를 찾으려는 욕망이 적극적인 소비를 하게끔 유도합니다."
최근엔 뉴시니어를 겨냥한 여러 마케팅이 쏟아지고 있다. 백화점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편집 매장을 열거나 40~50대를 타깃으로 한 여성 의류가 불티나게 팔린다.
"뉴시니어 세대의 문화적 욕구가 단순한 소비로만 표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야하는 거죠. 보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자신이 직접 기타도 쳐보는 등 행동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기타 판매량이 늘어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는 현재의 문화계에 부는 중년세대의 파워를 인정하면서도 이 열풍이 오래가지 못할 수 있음을 염려했다.
"그 세대의 거장들이 무대에 돌아온 것은 반갑지만 회고나 복고에 국한되면 안될 겁니다. 과거의 추억을 곱씹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일시적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들이 현재진행형의 뮤지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노래를 만들고,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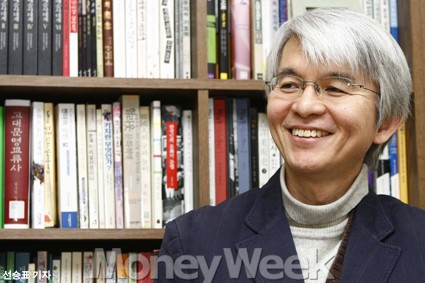
◆ 김창남 교수의 활력소 '더숲트리오 밴드'
화제를 돌려 뉴시니어의 삶을 살고 있는 김 교수의 개인 생활을 물어봤다. 김 교수는 2004년부터 성공회대 교수들로 구성된 '더숲트리오'의 리드보컬로 활동 중이다.
"밴드라기도 뭐한 그저 아마추어"라며 멋쩍어 하는 김 교수. '더숲트리오'란 이름은 '처음처럼'이란 소주 브랜드를 만든 손혜원 크로스포인트 대표가 지어준 이름이다.
"원래 노래를 부르고 기타를 치는 것을 좋아해요. 학교에서 교수들끼리 수련회를 갈때 기타를 치며 술을 마셨죠. 대학생 시절 MT 다녔던 것처럼 우리끼리도 그렇게 놀아요."
'노찾사'의 창립멤버이기도 한 김 교수는 밴드에서도 리드싱어를 맡으며 기타를 치고 있다. 밴드라고 부르는 것을 민망해 하면서도 학교 행사나 민주화 관련 행사에 부르면 마다 않고 달려간다.
"밴드 활동은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일에 몰두하다보면 자신의 삶을 잊기 쉬운데 밴드 활동은 나를 찾는 과정인 셈이죠."
김 교수는 학생들 앞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학내 교양 강좌인 '노래로 본 한국 사회'에 특별 출연해 학생들에게 청춘 시절의 얘기를 들려주며 노래를 불러주는 것이다. 학생들의 호응도 대단하다.
김 교수가 밴드에서 부르는 곡은 역시 대학시절 즐겨 부르던 김민기의 노래들이다. 무대에 오르면 김민기의 노래와 함께 70년대에 유행했던 포크송과 80년대의 민중가요를 부른다.
"최근에 노찾사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죠. 하지만 지금의 노찾사는 80년대와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노찾사는 당시의 시대적 책무였으니까요."
밴드에 대한 애착 때문이었을까? 연구실을 가득 메운 책들 속에 낡은 기타가 어울리지 않게 서 있다. 김 교수는 싸구려 기타라며 학교에서 한대 사줬으면 하는 바람도 내비쳤다. 사진 촬영을 빌미로 기타 연주를 부탁했다. 중학교 때부터 쳤다는 기타 연주 솜씨는 꽤 숙련돼 보였다. 아무곡이나 연주해달라는데 막힘이 없이 부드럽게 기타 현을 튕긴다. '싸구려 기타'를 연주하는 여유로운 손놀림에서 김 교수의 연륜이 묻어났다. 그가 TV에 나와 기타를 친다면 세시봉 버금가는 인기를 누리지 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