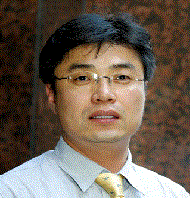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조윤선 전 수석이 지난달 18일 공무원연금개혁 불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지 1개월여가 흘렀다. 조 전 수석이 사의를 표한 시점인 지난 6일로 거슬러 올라가면 공백 기간은 더욱 길어진다.
당·청 소통 강화를 위해 공백을 빨리 메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만성화된 인물난과 내년 4월 총선 불출마 조건이 인선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후문이다. 최근에는 국회법 개정안이라는 난제까지 더해졌다.
정무수석은 당·청간 긴밀한 조율을 담당하는 '주무 수석'인데 박근혜 정부에선 지금껏 이정현, 박준우, 조 전 수석까지 3명의 수석이 1년을 넘기지 못하고 단명했다. 무엇보다 '소통'에 대한 당·청간 인식차가 원인으로 꼽힌다.
박근혜 대통령은 소통만 잘하면 됐지 정무수석을 꼭 정치인만 해야 하냐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기용한 게 외교관 출신의 박 전 수석이다.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조 전 수석은 최초의 여성 정무수석이었다. 모두 파격이었다.
여의도에서는 이들과 대화를 하려하지 않았다. 정치를 잘 모른다는 이유가 컸다.
정무수석은 우스갯 소리로 '여의도 민원수석'이라 불린다. 여의도 입장에서 보면 지역구 민원을 잘들어주느냐 여부에 따라 정무수석의 소통 점수를 메기곤 한다.
반면 대통령은 의원들을 만나 자신의 국정철학과 국정운영 방식을 여의도에 제대로 전파·설득해 주요 정책과제들의 입법화를 이뤄내는 정무수석을 원한다.
이처럼 정무수석에 대한 기대의 차이는, '소통'에 대한 인식차이에서부터 비롯됐다.
여의도는 청와대가 불통이라 비판하고, 청와대는 대통령의 메신저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그러다보니 정무수석들이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직 국회의원에 내부 승진설까지 하마평은 나오지만, 사람 찾기가 쉽지 않다. 빛나지 않고 욕만 먹고, 차기도 보장이 안되는데 굳이 나서려는 이가 없다고 한다.
정권이 반환점을 도는 시점이다. 비단 정무수석 자리 뿐이 아니다. 하지만 꼭 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다. 이번에는 박근혜 정부 '정무수석 잔혹사'의 고리가 끊어질지 지켜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