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자긍심과 미래 위해 기업 경쟁력 회복 속도 내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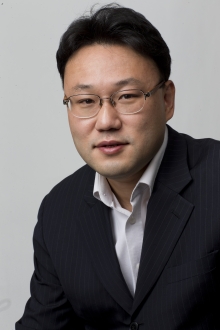
"우리 회사 주가가 10만원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최근 만난 국내 해운회사 직원은 "주가가 떨어져 현재는 손실을 기록하고 있지만, 회사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직원은 몇 개월 전 회사가 운영자금 조달 목적으로 실시한 유상증자에서 자사 주식을 주당 6000원대에 취득했다.
이 회사 직원들은 적게는 수 천주에서 많게는 수 만주에 이르는 회사 주식을 갖고 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회사는 최근 5년간 네 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했지만, 직원들의 애사심 덕분에 매번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직원들이 본인 몫뿐 아니라 기존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도 인수했기 때문이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의무감으로 증자 대금을 납부한 직원들도 있었지만, 이 경우에도 회사가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란 바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증자에 참여한 대부분의 직원들은 1인당 수 천 만원이 넘는 납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퇴직금을 담보로 회사에서 돈을 빌리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이 때문에 회사 주가가 오르지 못할 경우, 이들이 불안한 노후를 맞게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둔 후에도 수 십 년은 더 살아야 하는데, 회사를 관둘 때 빈털터리로 전락할 수 있어서다.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를 떠나게 될 경우에도 퇴직금과 위로금을 받기 보다는 대출금을 갚기 위해 다시 빚을 내거나 회사에 추가 담보를 제공해야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최근에는 자기 회사 주식을 시장에서 매수하는 직원들도 늘고 있다. 실적이 안 좋은 국내 대기업 임직원들이 책임 경영 의지를 시장에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주가를 떠받치게 한다는 시각이 많다.
1990년 후반 외환위기 당시 경영위기에 처한 증권사의 직원들이 회사 증자에 참여해 높은 수익을 거두기도 했지만, 몇 해 전까지 STX그룹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이직 후에도 대출금을 갚고 있는 것처럼 회사 주식 취득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회사 사정을 잘 아는 직원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자기 회사 주식을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
위기 상황을 겪는 기업들도 자구안을 내고 체질 개선에 나섰지만, 경쟁력 회복을 위한 과감한 부실정리 및 조직개편 속도가 더디고 가시적인 성과가 드물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의 경영난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데, 경영부실을 세계 경제의 불황 탓으로 돌리고 버티고만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독자들의 PICK!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파나소닉 창업자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기업 경영에서 호황과 불황은 모두 도움이 된다고 했다. 호황에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고, 불황은 자신과 회사를 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기업 회생이 지연될수록 실적과 주가는 지금보다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자기 회사 주식을 선뜻 산 직원들의 손실이 커지게 될 것도 자명하다. 경영진들은 직원들의 미래가 회사에 담보로 잡혀있다는 생각을 잊지 말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기업 회생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