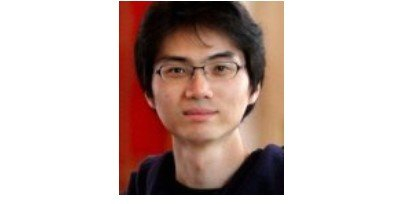[우리가 보는 세상]

유니폼 상의를 벗고 포효하는 황희찬. 2022 카타르 월드컵의 명장면이다. 그 순간 등장한 검은색 활동추적장치(EPTS), 이른바 '입는 GPS'도 놀라웠지만 그가 옐로카드를 받자 국민들은 또 놀랐다. 아무 것도 안 했는데 옐로카드라니. 국제축구연맹(FIFA)은 경기시간 관리 등을 위해 상의탈의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옐로카드를 준다.
이 '상탈 금지'에는 더 깊은 스토리가 있다. 손흥민·황희찬이 활약하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리버풀 클럽에는 1990년대 로비 파울러라는 전설적 선수가 뛰었다. EPL 통산 162골을 넣었을 정도로 유명한 득점기계였다. 그는 1997년 뜻밖에 2000스위스프랑, 현재 환율로 약 28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파울러는 그해 3월 유럽 리그의 한 경기에서 여지없이 득점했는데 이날따라 상의를 들어올려 그 안에 입은 셔츠를 드러냈다. 멀리서 보면 CK, 유명 브랜드 '캘빈 클라인' 같지만 사실은 달랐다. CK 위아래 깨알같이 새긴 글귀 전체는 '1995년 9월이후 500명의 리버풀 부두노동자(Dockers)가 해고됐다'는 것이다. CK는 부두노동자를 말하는 '도커스'의 중간 두 글자였다.

유럽축구연맹(UEFA)은 "경기장 안에서 어떤 정치적 행위도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부두 노동자들의 사정을 알아 달라는 파울러의 세리머니는 정치행위로 간주됐다. 그는 벌금을 물어야 했다. 일부 그를 응원하는 반응도 있었다. 이 이야기는 탁민혁·김윤진 '10대와 통하는 스포츠 이야기'(2019)에 자세히 실려있다. 월드컵의 규정 또한 명분은 시간관리지만 정치적 발언이나 행동을 금지한 것 아닐까.
반대로 월드컵이 과감히 깨부순 금기도 있다. 프랑스 태생 스테파니 프라파르 심판은 92년의 월드컵 사상 처음 본선 경기 여성 주심으로 나섰다. 코스타리카와 독일의 E조 조별리그 3차전이었다. 프라파르는 이미 남자 축구대회 심판을 본 적도 있는 독보적 여성심판이다. 주최국 카타르의 여성차별과 인권 문제는 비판 받았지만 여성 주심의 존재는 분명 한 걸음 나간 것이다.
사상 첫 중동 월드컵은 '생각의 금기'도 깼다. 중동은 너무 덥고 인프라도 열악해 월드컵을 치를 수 없을 거란 시선 말이다. 아시아 팀은 약체라는 고정관념을 깨듯 한국·일본·호주는 동시에 16강에 진출했다. 독일, 벨기에 등 '강호'들이 일찍 짐을 쌌고 모로코가 '아프리카 돌풍'으로 12일 현재 4강에 진출한 것도 모두 금기를 깬 면이 있다.
금기까지는 아니지만 극복해야 할 과제가 더 있다. 축구경기에 국가는 물론 개개인의 성패까지 투사하는 과몰입 말이다. 그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월드컵은 엄밀히 국가 대항전도, 대리전쟁도 아니다. 대표팀이 졌다고 마치 나와 대한민국이 실패한 것처럼 여길 필요는 없다. 성과가 좋지않은 일부 선수를 희생양 삼아 비난을 쏟아내서도 안 된다.
독자들의 PICK!
우리는 월드컵을 보며 기뻐하고 낙심도 했다. 무엇보다 '꺾이지 않는 마음'을 확인했다. 모든 금기 앞에 이 마음을 가져보자. 미친듯이 응원하지 않으면 어떤가. 열광은 환영, 동시에 좌절금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