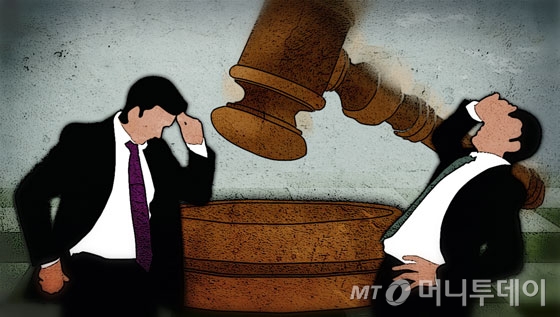
공공발주 대규모 IT 사업에서 또 잡음이 불거졌다. 지난해 9월 대규모 마비 사태가 발생했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야기다. 이번에는 발주자 측인 정부와 사업을 진행해 오던 업계간 의견차가 크다. 자칫 책임공방이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공공 IT 사업에 대한 업계의 불만은 뿌리가 깊다. 민간 사업에 비해 계약금액(단가)도 박하게 책정되는 데다 SW(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는 최초 공급 이후 유지보수율도 과하게 낮다는 게 거의 정설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공공 IT 사업은 정부 사업을 수주했다는 실적 확보 외에는 수익성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기업이 일단 정부·공공 부문에 납품한 실적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안정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고 평가되지만 여전히 수지맞는 장사는 아니라는 얘기다. 민간과 달리 공공사업은 발주자인 정부·공기업 쪽의 요구가 깐깐하기 이를 데 없다는 불만도 있다. 이 때문에 실제 한 때 공공 IT 시장의 주축을 차지했던 대기업 계열 SI(시스템 통합) 업체 대부분이 공공 시장에서 발을 뺀 상태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지난해 9월 대규모 장애 사태가 초래된 후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2020년 사업 개시 후 업계에서 추가로 들인 인력·시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아직 완료되지 못한 사업까지 추가로 진행한다면 업계가 떠안아야 하는 손실이 크게 불어나는데 발주처인 복지부가 비용증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LG CNS 등 이번 사업을 맡은 컨소시엄사들이 최악의 카드인 계약해지를 염두에둔 이유다.
복지부 입장은 다르다. 계약 전에 마스터플랜(ISMP) 수립을 통해 적정한 총사업비를 산정·편성했고, 계약 후 과업이 추가된 부분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업이 완료시점에서 5개월 이상 지났지만 마무리가 안되는 것은 업체의 과실탓이라는 판단이다. 실제 코로나19(COVID-19) 이후 IT 전문인력의 부족이 심화되던 당시 컨소시엄 업체들의 인력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투입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24일 자료를 통해 "사업자가 중도 포기 등에 관한 (문서를 통한) 공식적 의사표시는 없었다"며 "포기 시에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마스터플랜 수립 등의 절차가 사업예산의 과소편성에대한 업계의 불만을 다스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은 여전하다. 애초 정보화 사업 예산이 여타 국가 예산사업들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관심도가 낮은 탓에 이같은 민간·공공간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IT업계에서는 공공시장에서의 '제값받기' 캠페인을 벌일 정도로 공공시장에서의 '후려치기' 관행은 고질적이고 여전히 해법마련이 요원하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만들어져 공공·민간의 디지털 대전환을 도모하는 시점인데 아직 민간·공공에서는 단가 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이 안타깝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