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끈따끈 새책] ‘사죄 없는 사과사회’…조직의 운명을 바꾸는 진짜 사과와 거짓 사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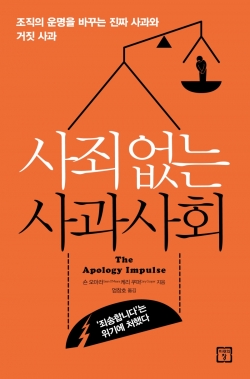
잘못에 대한 사과가 수없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어떤 사과가 진정한 사과인지, 사과했는데 사과로 느껴지지 않는 이상한 물음표들이 도처에 생기고 있다.
최근 인플루언서들이 협찬을 받고도 광고 표기를 하지 않은 ‘뒷광고’와 관련해 수많은 사과를 내뱉었다. 하지만 사과는 했지만, 반성의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유튜버가 등장하는가 하면, ‘잘 몰랐다’ 식의 해명을 늘어놓은 몇몇 유튜버들도 나타나면서 여론은 빠른 속도로 등을 돌리고 있다.
분노와 비난이 넘치는 현대사회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이 책은 진짜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이상한 방식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죄송하다’는 단어를 내뱉지 않고 미안해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급급하다가 결국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조직과 CEO들의 행태를 신랄하게 꼬집는다.
인터넷 사이트, 뉴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자주 접하는 사과의 표현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등이다. ‘깊이’ ‘진심’이 주는 의미에서 진정성을 드러내려 하지만, 흔히 쓰는 일상어처럼 느껴져서인지 그 무게감이 예전 같지 않다.
2018년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의 사과, 페이스북 정보 유출 논란으로 인한 마크 저커버그의 직접 사과 성명 등도 마찬가지.
저자는 “최근 많은 기업이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잘못을 저지르는 즉시 발 빠르게 사과하고 있다”며 “하지만 사과문은 미안해하는 듯하지만, 진정성이 의심되는 때가 있는데 곤혹스러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상황을 왜곡하고 재구성해 사과의 말을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저자는 나쁜 짓을 하고도 사과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사회에 해를 끼치는 새로운 현상을 짚어냈다. 이는 사과해야 할 사안인지, 누구에게 사과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로 사과해야 하는 일인지에 대한 판단 없이 필사적으로 사과부터 먼저 내놓으려고 하는 현상이 유행처럼 번지기 때문.
저자는 이를 ‘사과 충동’(Apology Impulse)이라고 말한다. 작은 비난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나비효과처럼 파급력이 커질 수 있기에 사소한 일이나 되레 사과하는 것이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에서도 무턱대고 사과를 한다.
독자들의 PICK!
그로 인해 진중한 사과가 필요한 상황에서 ‘미안하다’는 말에 무게가 실리지 않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누구나 충동을 바탕으로 움직이면 부분을 놓치거나 실수하기 마련이다.
사과의 위기는 일상의 위기이자 인간관계, 정치, 비즈니스의 위기다. 그 위기를 더 위험하게 내모는 행태가 사과인 듯 사과 아닌 사과 같은 사과다. 이른바 제한적 사과 또는 책임 회피형 사과가 그렇다.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그러나’ 또는 ‘하지만’ 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엉뚱한 데로 빠지는 유형이다.
곧이어 제한조항이 따라온다고 경고하는 접속사가 붙으면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어도 사과의 효과는 약해진다. 이런 식의 사과는 대체로 실망만 안겨준다.
사과는 간단해서도 안 되지만, 복잡해서도 안 된다. 조직이나 대변인이 사과를 전할 계획을 세울 때, 사과의 핵심 기능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기능은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해명하고 책임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보상을 제시하고 마지막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이 순서대로 사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사죄 없는 사과사회=숀 오마라, 케리 쿠퍼 지음. 엄창호 옮김. 미래의창 펴냄. 392쪽/1만7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