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아빠의 육아휴직기] < 20주차 > 육아와 자극 관리

아이가 언제까지나 잘 먹을 줄 알았다. 신생아 때부터 남다른 먹성을 갖춰 몸무게며 키 모두 상위 95% 수준을 유지했다. 올록볼록한 아기 팔다리를 어루만지면서 최대한 오래 이 상태를 지켜주기로 다짐했다. 분유만 먹다가 죽 형태의 초기 이유식, 덩어리 진 후기 이유식으로 옮겨가는 것도 수월했다.
그런데 밥태기(밥+권태기)가 벼락같이 찾아왔다. 전조 증상도 없었다. 전날 저녁까지 이유식을 잘 먹은 아이가 다음 날 오전부터 이유식을 거부했다. "드디어 올 게 왔구나" 하는 마음과 함께, 밥태기가 길어지면 혹시 아이에게 저혈당이 오거나 성장에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찾아왔다.

커뮤니티나 블로그, 유튜브 채널마다 밥태기 극복 노하우를 담은 콘텐츠가 넘쳐났다. 어떤 채널은 자기주도 이유식으로 식사 방법을 바꿔야 한다며 아이가 손에 쥐고 먹을 수 있는 스틱 형태의 이유식 레시피를 올렸다. 어떤 블로그는 밥맛이 없어서 그럴 수 있다며 은근슬쩍 식품첨가제 뒷광고를 했다.
여러 레시피를 참고해 우선 고구마와 쌀가루 등을 버무린 스틱을 만들고 에어프라이어에 튀겼다. 소고기 역시 스틱 형태로 만들었다. 아이가 한 손에 잡고 먹을 수 있도록 만든 것. 원래 이유식을 먹일 때 부모가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어줬는데, 최근에 아이 스스로 숟가락질 흉내를 내던 게 생각났다. 자기주도 이유식을 시작할 때가 됐다는 판단도 들었다.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다. 처음에 한두 개는 잘 먹더니 이후엔 이유식 스틱을 그저 '장난감'으로 인식했다. 먹지 않는 고구마 스틱은 가루가 되어 집안 곳곳에 산산이 흩어졌다. 소고기는 며칠 먹지 않더니 다 상해서 버렸다. 자기주도 이유식은 시기상조였다.
조급해하는 우리 부부에게 아이 둘을 키운 처형이 넌지시 알려줬다, "아이들은 자기가 배고프면 다 알아서 자기주도적으로 먹을 걸 찾게 된다. 너무 일찍부터 자기주도 이유식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자기주도 이유식은 당분간 시도하지 않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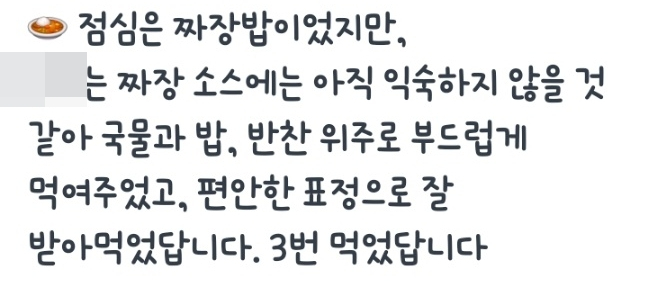
밥태기를 풀어낼 단서를 찾지 못한 채 며칠이 지났다. 그저 어르고 달래며 아이가 입을 벌릴 때 몰래 음식을 넣는 수밖에 없었다. 그마저도 아이가 음식을 씹지 않고 손가락으로 내용물을 꺼내 여기저기 집어던지는 탓에 식탁 주변 바닥이 다 축축해지고 옷은 음식물에 적셔졌다. 그나마 분유는 평상시와 같은 양을 먹어 다행이었다.
밥태기가 시작된 주에 어린이집에 첫 등원을 시작했다. 어린이집에 들려 보낸 첫날 이유식도 역시나 그대로 돌아왔다. 원장선생님이 가정 이유식 대신 다른 아이들이 먹는 저염식 식사를 한번 줘보겠다고 했다. 별다른 기대 없이 맡겨봤다. 그런데 예상외의 결과가 나왔다. 식사를 다 한 뒤에 추가로 준 음식까지 먹었다는 것. 이틀째에는 밥을 한번 추가, 사흘째에는 두 번 추가해서 총 세 그릇을 먹었다고 알려왔다.
독자들의 PICK!
어린이집 식단표에는 밥, 부추 된장국, 오리 주물럭, 콩나물무침, 백김치가 적혀 있었다. 집에서 먹이던 이유식과 다른 점은, 음식을 갈지 않고 그대로 준다는 것. 그리고 밍밍한 저염식이지만 국물을 끼워준다는 것이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밥태기는 그냥 기존에 먹던 이유식에 질려서 입맛이 떨어진 상태라는 것, 그리고 이를 극복하려면 새로운 메뉴로 아이 식욕을 돋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먹이던 '무염식'을 졸업해야 할 시기라고 느꼈다. 소고기와 양파, 당근, 브로콜리를 따로 갈아서 주던 건 유지하되 죽 대신 맨밥을 주기로 했다. 또 약간의 '간'을 해 자극을 추가하기로 했다. 바야흐로 후기 이유식에서 유아식으로의 전환이다.
저염식 아기 간장 대신 주변에서 추천받은 밥새우를 먼저 시도했다. 밥에 섞어 먹는다고 밥새우인 줄 알았더니, 새우 자체가 밥풀 정도로 작아서 밥새우였다. 밥새우를 섞은 밥은 무척 잘 팔렸다. 한동안 이유식을 끊다시피 했던 아이가 1인분을 다 먹었다. 감격이었다.
자극도 반복되면 무뎌지는 법. 다른 자극을 돌아가며 주기로 했다. 후기 이유식에 얹어 주던 치즈 대신 에그스크램블을 따로 만들어 단백질을 보충하기로 했다. 역시 밥과 섞으니 아이가 아주 잘 먹었다. 여기에 마지막 '킥'으로 조미료 없는 아기용 김을 싸기 시작했다. 다른 부모들이 항상 "김은 실패가 없다"고 하더니 그게 맞았다. 벼락같이 찾아왔던 밥태기는 일주일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초기·후기 이유식을 무염식으로 줬던 건 아이에게 자극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육아원칙 때문이었다. 아기들은 위장도 미숙하고 콩팥도 덜 발달했기 때문에 너무 짜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해로울 수 있다. 또 처음부터 강한 맛에 익숙해지면 나중에 심심한 음식을 거부할까 우려된 것도 있다.
부모가 아무리 늦추고 늦춰도 아이가 먼저 자극을 요구하는 때가 온다. 아빠 기침 소리에도 놀라서 자지러지게 울던 아이가 이제는 시끄럽게 놀아달라고 보채는 것처럼 말이다. 밥태기도 그중 하나일 것이다. 분유만 먹다가 당근 퓌레를 맛보고 눈이 동그랗게 변하던 아이가 이젠 무염식을 거부하는 수준이 됐다.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급격하게 성장했다는 게 느껴진다.
그래도 여전히 아기는 아기다. 성인과 비슷한 식단 구성이지만, 여전히 재료는 잘게 자른다. 얼마 전에는 구운 소고기를 손톱만한 크기로 잘라줬더니 이걸 삼키지 못하고 10여분 동안 껌처럼 씹고 있었다. 성장하는 아이의 속도에 맞춰 적절히 자극의 정도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도 부모의 몫이라고 느꼈다.
아이는 점점 클 것이고 시간이 갈수록 더 큰 자극을 원할 것이다. 그림책에 몰두하던 아이가 TV 보여달라고 조르고, 스마트폰 사달라고 떼쓰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일 수 있다. 어떤 기준으로 자극의 정도를 통제하며 아이를 키워야 할까. 갓 1년 키운 아이의 밥태기를 지켜보며 앞으로 10여년 육아 고민까지 미리 당겨보는 요즘이다.

